수학능력시험, 그 잔인한 착각 (3)
by 유로저널 posted Dec 05,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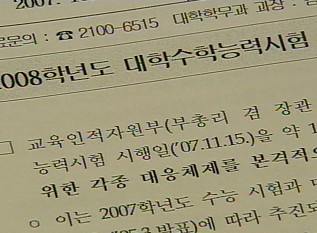
대학수학능력(大學修學能力), 네이버 사전을 검색해보니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 기관에서 교육 과정의 차례에 따라 베푸는 학업을 닦을 수 있는 능력’, 즉, 대학 교육과정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해마다 수 많은 수험생들을, 그들의 가족과 지인들을 가슴 졸이게 만드는, 때로는 귀한 생명마저 스스로 끊게 만드는 그 수학능력시험이 진정 대학 교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감별할 수 있는 측정 도구가 될 수 있는가?
물론, 이 역시 너무나도 복합적이고 거대한 주제이며, 무엇보다 본 주제를 제대로 건드리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나라 대학들이 진짜 ‘대학’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는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쉽게 단정지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능력시험을 직접 치르고 대학 교육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수학능력시험을 가르쳐본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해외 교육기관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수학능력시험이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 그저 높은 경쟁률 속에서 그 경쟁을 가장 잘 치른 이들을 고르는 데 그치는 수준 낮은 시험이라는 사실에 공감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밝히지만 수능을 잘 치르기 위해 투자한 노력을 평가절하하거나, 수능을 잘 치른 이들의 수준을 무조건 무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무언가를 위해 가장 노력한, 가장 인내한 이들에게 대학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게 본래 취지라면 할 말 없지만, 단지 그것만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라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전통적으로 우리 나라 교육에서 사용되어온 평가 방법은 다지선다형의 문제와 함께, 그것도 열 개 중 한 개의 예외가 있을 경우 나머지 아홉 개를 원활하게 익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한 개의 예외를 암기했느냐, 안 했느냐를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을 두는 방식이었다. 그러다 보니 비록 시험 점수는 잘 받았을 지라도 실제로 활용 가능한 지식으로 남는 게 별로 없다. 무언가를 익히도록 하기 위해 존재하는 시험이 아니라 시험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시험인 까닭이다.
그나마 필자가 전공한 영어라는 과목만 봐도 사실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에 있는 영어라도 원활하게 구사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회화 수준은 상당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해마다 수많은 한국인들이 영어를 익히기 위해 해외로 나서지만 사실 그렇게 해외에 나와서 배우는 것들의 대부분은 우리가 중학교 시절에 배운 영어 수준일 뿐이다. 문제는 그것을 단지 시험을 치르기 위해 외웠을 뿐이냐, 아니면 실제 활용이 가능하도록 익혔느냐의 문제인데, 결국은 초중고 시절 그토록 많은 단어를 외우고, 시험을 치르고도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에 있는 내용조차 진정 본인의 것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왜냐면 영어 교사들 조차 기본적인 영어라도 잘 익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시험문제에 잘 나오는, 헷갈리는 것들을 암기시키고 주입시킨 탓이다. 그리고, 결국 그 연장선상에는 수학능력시험이 어이없는 위력을 자랑하며 마치 교육의 최종 목적지(?)인 양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수능 영어를 만점을 받았다 한들, 영어로, 특히 말하기나 글쓰기로 간단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이가 몇 명이나 될까? 물론, 어린 시절부터 해외 경험을 했거나, 또는 민사고나 외고 진학을 목적으로 중학교때부터 고액의 토플 강의를 들은 이들은 제외한다.
어쨌든, 현재 수능이 표방하고 있는 교육과 평가 방식으로는 발표력이나 글쓰기를 통한 표현능력, 토론능력, 창조적인 사고와 문제 해결능력과 같은 것들은 절대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사실, 정말 제대로 된 대학교육에서 요구되는 소양은 위와 같은 것일진대, 또 사회 생활에서는 더더욱 그것들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세계적으로 상당한(?) 지명도를 자랑하는 우리 대학들이 거의 고등학교 교육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수준인 까닭에, 그리고 사회 나가서는 어차피 신입사원 하면서 모든 걸 새로 배우기에 수능은 결코 바뀔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 전반을 결정하는 높은 양반들도 이러한 능력에 대해 무지할뿐더러 이를 가르치고 평가할 교사나 장치도 없다. 해외에서 이러한 부분을 체험하고 이러한 교육을 감당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인재들은 철밥통만 노리고 달려드는 이들과 경쟁하기 싫어서 아예 이러한 분야에 들어서지 않는다. 결국, 이 모든 게 조금씩 겉모양만 바뀔 뿐 21세기에 들어서도 여전히 이전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수능점수에 목숨을 걸고 12년간 공부한 결과 자기 의사를 표현하거나 토론, 글쓰기와 같은, 막말로 수능과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러나 해외 교육에서는 무엇보다 중요시 여겨지는 영역에 들어서면 아예 맥을 못 추는 우리 학생들... 다섯 개의 보기 중 한 개를 골라내는 능력이 수능을 마치고 나면 거의 쓸모가 없어진다는 잔인한 사실을 과연 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다음 주 마지막 회

Articles
-
 영어의 노예들 (1)
영어의 노예들 (1)
-
 뒷모습이 아름답고 싶다
뒷모습이 아름답고 싶다
-
 타임캡슐
타임캡슐
-
 나이 서른에 우린
나이 서른에 우린
-
 어머니라는 이름의 바다
어머니라는 이름의 바다
-
 아버지라는 이름의 산
아버지라는 이름의 산
-
 수학능력시험, 그 잔인한 착각 – 마지막
수학능력시험, 그 잔인한 착각 – 마지막
-
 수학능력시험, 그 잔인한 착각 (3)
수학능력시험, 그 잔인한 착각 (3)
-
 수학능력시험, 그 잔인한 착각 (2)
수학능력시험, 그 잔인한 착각 (2)
-
 수학능력시험, 그 잔인한 착각 (1)
수학능력시험, 그 잔인한 착각 (1)
-
 어떻게 얻었느냐가 중요하다
어떻게 얻었느냐가 중요하다
-
 90세의 바이올린 연주가를 보며 흐르던 눈물
90세의 바이올린 연주가를 보며 흐르던 눈물
- 한국 직장문화 유감 - 마지막
-
 한국 직장문화 유감 (3)
한국 직장문화 유감 (3)
-
 한국 직장문화 유감 (2)
한국 직장문화 유감 (2)
-
 한국 직장문화 유감 (1)
한국 직장문화 유감 (1)
-
 영국 2년차
영국 2년차
-
 Bridge over troubled water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
Bridge over troubled water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
-
 인생이라는 거대한 무대에 올라선 배우들
인생이라는 거대한 무대에 올라선 배우들
-
 사라지지 말아야 할 것들이 사라져가는…
사라지지 말아야 할 것들이 사라져가는…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