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
|
2008.02.20 06:41
영어의 노예들 – 마지막
조회 수 2372 추천 수 0 댓글 0
 오늘은 ‘영어의 노예들’ 마지막 시간이다. 사실, 시작하면서는 뭔가 예리한 분석과 획기적인 대안을 함께 고민하고, 나눠 보려는 야심찬 의도가 있었건만, 대한민국의 날고 기는 영어 및 교육 전문가들도 어쩌지 못하는 문제를 감히 어찌 필자와 같은 조무래기가 건드릴 수 있겠는가라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지난 시간에 예고한 대로 오늘 이 시간에는 필자의 삶에 드리워진 영어 이야기를 나누려 한다. 물론, 이것은 영어 학습과 관련된 어떤 방법론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별볼일 없는 필자의 이야기를 통해 단 한 명의 독자에게라도 영어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작은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램이다. 필자 역시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당시 유행하던(?) 문법, 독해 중심의 영어를 익혔다. 유명한 S기초영문법부터 종합영어까지 익히고, 수 많은 단어 시험을 치러왔다. 그 시절 그럼에도 영어가 참 좋았던 것은 일찍부터 외국 영화와 팝송에 심취했던 탓에, 팝송 가사나 영화의 영어 제목을 익혀 가면서 나름 영어와 친해졌던 것이었다. 특히, 미국의 Folk Music을 좋아했던 탓에, 가사의 의미가 유난히 중요한 노래들을 많이 들었고, 자연히 그 의미를 알고 싶어했다. 가령, 중학교 시절에 심취했던 밥 딜런의 ‘Blowin’ in the wind’나 사이몬&가펑클의 ‘Bridge over troubled water’같은 노래들은 그 가사가 마치 한 편의 시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고, 사실 관심만 있다면 중학생 수준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영어였다. 신기한 것이 그렇게 스스로 빠져들어 익힌 (물론 당시에는 무언가를 익히고 있다는 개념도 없었지만) 것들은 절대 의식에서,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가령 우리가 흔히 가정법을 배울 때 접하는, ‘If절, would절’을 공식처럼 외우고, ‘만약 ~라면, ~했을텐데’를 기억하려 애쓰는 대신, 에릭 클랩튼의 ‘Tears in heave’의 첫 소절인 ‘Would you know my name if I saw you in heave?’을 통해 자연스레 if와 would의 개념을 익힐 수 있었던 것에 (당시는 에릭 클랩튼의 ‘Unplugged’ 음반이 발매 되었던 중학교 2학년 시절이었다) 지금도 감사할 따름이다. 영화 제목이나 간단히 대사들도 우리말로 의역된 제목에서 그치지 않고 항상 원제목을 알아내어 무슨 뜻인가를 확인하곤 했다. 가령, ‘사랑과 영혼’ 같은 경우 원제목은 ‘Ghost’, 즉 ‘유령’이었는데 눈물샘을 자극하는 멜로가 주된 플롯인 본 작품의 제목을 괴기영화스럽지 않게 선보이고 싶었던 국내 배급사의 멋진 아이디어로 우리에게는 ‘사랑과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영화와 음악을 통해 자연스레 흡수했던 영어와 영어 문화권의 단편적인 조각들이 훗날 실제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영어를 활용하는 데 더 없이 큰 도움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한편, 문법이나 어휘 암기가 영어의 전부는 결코 아니지만 그 시절 익혔던 문법과 어휘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어쨌든, 그렇게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들어가서 외국인 강사의 수업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외국인과 영어로 의사소통을 경험했다. 물론, 영어를 직접 사용한 의사소통은 중고등학교 시절 학교에서 배운 영어, 특히 수능 영어와는 상당히 다른 그것이었고,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너무나 흥미로웠던 기억이 생생하다. 아쉽게도 영어영문학을 전공했지만 사실 대학에서 배운 영어는 필자의 영어 인생에서 아주 미미한 부분을 차지할 뿐이다. 본격적으로 영어에 흥분(?)을 느끼기까지 한 것은 군 제대 후 종로의 한 회화학원을 다니면서부터였다. 당시 필자의 반을 담당했던 미국인 강사 Bob과 사적으로 친구가 되어 같이 소주잔을 기울이는 사이가 된 것이다. 물론 그 시절 필자의 회화 실력은 결코 유창한 그것이 아니었지만, 그저 친한 술친구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영어였기에 조금도 실력에 대한 어떠한 평가나 부담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러던 어느날 Bob은 필자에게 미국에 가서 본격적으로 영어를 익힐 것을 권했고, 자신이 직접 강사로 있었던 보스톤의 한 기숙학교를 추천했다. 당시 Bob이 필자에게 미국행을 권하면서 “I think you’re ready.”라는 말을 했던 게 기억난다. Bob은 결코 필자의 영어가 뛰어나니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필자의 마인드가 외국인과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했다. 지금 돌아보면 우리는 너무 잘 하는 영어, 능숙하거나 완벽한 영어를 할 생각만 하지, 진정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과 소통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 감정의 준비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미국에서는 학교에서도, 일상 생활 속에서도 참 많은 경로를 통해 영어와 친해질 수 있었다. 당시에도 역시 필자의 영어를 냉정히 평가해보면 어설픈 그것에 지나지 않았지만, 표현하려는 것은 최선을 다해 분명 표현했다는 자신감이 늘 있었던 것 같다. 외국 학생들 앞에서 발표를 하면서 ‘teach’의 과거형으로 ‘taught’라 해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teached’라고 해버렸다는 것을 깨달으면서도, 주눅들지 않고 전하려던 내용을 전하는데 충실했던, 그리고 그들과 마음으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었던 시간들을 통해 영어는 더 이상 평가의 대상이, 경쟁의 매개체가 아닌 나와 또 다른 세상을 연결해주는 소중한 통로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당시 이태리에서 온 외국 여학생과 연애질을 하면서 하루에 10시간 가까이 영어로만 의사소통할 기회가 자연스레(?) 주어진 것도 참 감사한 일이었다. (사실, 그녀는 아랍어, 불어, 이태리어, 영어를 모두 거의 완벽하게 구사하는 외국어 괴물이었다) 학교 졸업식 때 직접 만든 영어 가사 노래를 부르는 등, 그 시절에는 억지로 영어를 익히기보다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실행하기 위해 자연스레 필요한 도구로 영어를 사용하는 경험을 했던 것 같다. 그 외에도 미국에서의 이야기는 예전 ‘Dear Joseph’ 편에서도 밝혔듯이 Joseph Ferolito와의 만남을 통해 어떻게 영어로 글쓰기를 익혔는가를 나눈 바 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필자는 여전히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다. 요즘도 사무실에서 외국인들의 전화를 받다가 가끔 못 알아듣는 발음이나 단어가 있으면 쪽팔림을 무릅쓰고 스펠링을 불러 달라는 황당한 부탁을 하곤 하는걸. 그럼에도 필자는 영어의 노예가 아니라는 점만은 자부한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과, 또 대한민국 모두가 영어의 노예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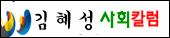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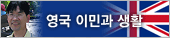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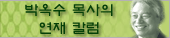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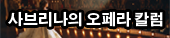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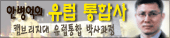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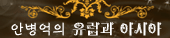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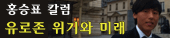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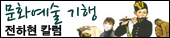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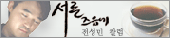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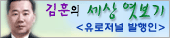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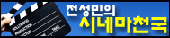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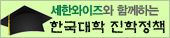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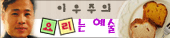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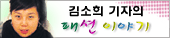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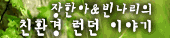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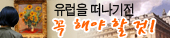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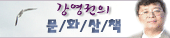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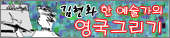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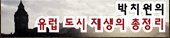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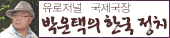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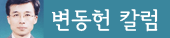
 하나의 상처가 아물고
하나의 상처가 아물고
 영어의 노예들 (4)
영어의 노예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