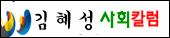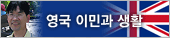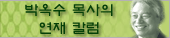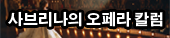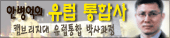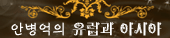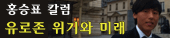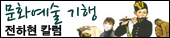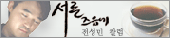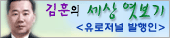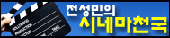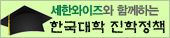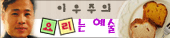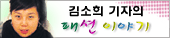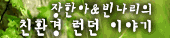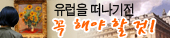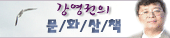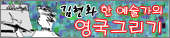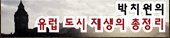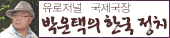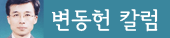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
|
2014.01.13 23:06
그냥 계속 ‘서른 즈음에’로 남기로 했습니다.
조회 수 1537 추천 수 0 댓글 0
2013년 1월 첫 주에 작성했던 글의 제목은 ‘서른 즈음에의 마지막 해’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014년도부터는 조금씩 마흔에 가까워지는 나이가 되는 만큼, 제 칼럼 타이틀을 ‘마흔 즈음에’로 바꾸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대로라면 신문사에 요청해서 지난 주(새해 들어서 첫 주) 신문부터는 타이틀을 ‘마흔 즈음에’로 바꿨어야 했는데, 결국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의 실제 나이대로라면 ‘서른’ 즈음이라고 하는 게 더 이상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지난 1년 간 저를 곰곰이 돌아보니 저의 정서적인 나이는 ‘서른 즈음에’를 처음 연재하기 시작했던 서른 즈음의 그 시절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쩌면 더 나아가서 저의 정서적인 나이는 한국을 떠났던 2005년 이후로 영국에서 지내는 동안에는 그대로 멈춰버린 것 같기도 합니다. 정서적인 나이 뿐만이 아니라 저의 취향이나 심지어 제가 입는 옷의 스타일이나 신고 있는 신발들조차 한국을 떠났던 시절 갖고 온 신발들을 아직도 신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한국에서 휴가를 보낼 때 만났던 중학교 동창 친구녀석은 제 신발(영국을 떠나기 전 한국에서부터 신던 여름용 슬리퍼)를 보더니 어떻게 아직도 이런 걸 신고 다니냐며 어이가 없어하더군요.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유행이 바뀌고 또 그 유행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한국에서 사는 친구의 심정이야 이해했습니다만, 저로서는 10년 전에 신던 신발이 여전히 멀쩡했고, 그래서 그것을 계속 신는 게 그저 편했을 뿐입니다. 사실, 그렇게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거의 모든 것들이 사라졌거나 변해 있었습니다. 영국에 사는 사람치고는 그래도 저는 일 년에 한국을 최소 두 번씩은 방문했으니 한국을 제법 자주 방문하는 편인데도 (물론 그러기 위해서 유럽 여행을 자제했지만), 정말이지 한국을 방문해보면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새로 생겨나고, 또 기존의 것들이 바뀌어 있더군요. 그것은 단순히 내가 좋아했던 거리나 음식점 같은 것들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저는 여전히 영국을 떠나기 전의 전성민 그대로인데, 사람들, 특히 제 또래 사람들은 모두 그 사이에 어른이 되어버린 것 같고, 또 저마다 각자의 삶을 찾아 어디론가 멀리 떠나가버린 듯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다녔던 고향 교회를 찾아가보면 더 이상 아는 얼굴이 없어진 것처럼 장소의 이동 차원에서 떠나간 사람들도 많지만, 그와 함께 정서적인 차원에서도 지난 날의 그 자리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모든 면에서 현실적이 되었고, 그것은 곧 그들이 어른이 된 것이고 철이 든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그들에 비해 비현실적인 것만도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현실적인 것들도 잘 챙겨가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저는 여전히 동심을 잃지 않고 싶고, 순수했던 시절의 꿈과 가치를 떠나 보내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성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삶에 책임져야 하는 만큼, 저 역시 아무에게도 내색하지는 않지만 어마어마한 현실의 책임에 그야말로 어깨뼈가 부서질 듯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안정된 삶과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 머리도 굴리고, 땀도 흘리고, 할 수 있는 모든 재간을 부리며 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그것만이 전부인 듯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삶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일 뿐, 결코 우리가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상 어디선가는 한 편의 시가 쓰여지고 읽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덕분에 안정된 삶과 부귀영화만이 전부인 듯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나마 숨통을 트이고, 메마른 가슴을 간간히 적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편의 시가 쓰여지고 읽혀지는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흔히 ‘철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나이면 좋아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여전히 좋아하고, 그 나이면 버려야 할 가치들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으니, 오직 현실적인 척도로만 살아가는 어른들의 눈에는 당연히 철이 없어 보이겠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는 늘 어린 시절의 동심으로 회귀하고 싶어하고, 작은 것에도 신기해하고 작은 것에도 즐거워하는 어린이들의 순수함을 부러워합니다. 오죽하면 한국 방송계에서 가장 치열한 주말 예능의 주요 프로그램들이 어린이들을 내세우겠습니까? 마흔 즈음에 다가서고 있는 제가 그럼에도 여전히 서른 즈음의 정서로 글을 쓰는 것 또한 철이 없어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왠지 타이틀을 ‘마흔 즈음에’로 바꾸고 나면 더 이상은 철 없는 이야기를 맘 편히 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의 정서적인 나이가 여전히 서른 즈음에 머물고 있는 것 또한 타이틀을 계속해서 ‘서른 즈음에’로 유지할 수 있는 나름 훌륭한 변명 거리가 될 듯 합니다.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