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
|
유로저널 와인칼럼
2014.02.10 21:03
박 우리나라의 프랑스 와인 기행 7 : 와인의 나라에서 막걸리를 생각하다.
조회 수 3226 추천 수 0 댓글 0
박 우리나라의 프랑스 와인 기행 7 : 와인의 나라에서 막걸리를 생각하다. “조선시대에는 집집마다 고유의 술이 있었다. ...... 한 마디로 우리나라는 명주를 집집마다 빚었던
술의 나라였던 셈이다.” - 허영만
<식객> 5권 ‘술의
나라’ 중에서
누군가는
프랑스 와인 기행에 막걸리가 웬 말이냐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얼마
전 막걸리를 비롯한 우리 전통주에 대한 우리나라 언론의 기사를 읽었다. 그 기사에서
인용한 <식객>의 문장을
읽고 머릿속에 떠오른 장면은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우리네 시골 마을, 집집마다
자기만의 술이 익어가던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이미지와 겹쳐지는 곳이 있었으니 그곳은 다름 아닌,
명실상부한 술의 나라 프랑스, 그중에서도
세상에서 가장 멋진 와인들이 오밀조밀 모여있는 ‘황금의 언덕(COTE
D’OR)’ 부르고뉴였다.
필자가 우리나라를 떠나 이곳 프랑스에 살면서 가장 그리운 음식은 다름이 아니라 감칠맛 넘치는 막걸리이다. 그리고
이곳 프랑스를 떠나게 될 때 가장 그리울 음식은 아마도 치즈가 될 것이다. 물론
프랑스에 있는 한국식품점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수입된 막걸리가 있고, 우리나라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가면 프랑스의 치즈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가? 현지보다 훨씬 비싼 가격?
그것도 물론 문제이긴 하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들이 ‘살아서’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막걸리를 만들 때 중요한 요소가 여럿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효모균이다. 김치며,
된장이며, 우리네 조상들의 특기가 바로 이 발효법인데 막걸리도 매한가지다.
그런데 이런 균이 살아있는 전통방식의 막걸리, 이른바 생막걸리는
유통기한이 10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몇
년 전 장기보관을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서 냉장보관 시, 한 달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서 냉장 컨테이너를 통해 일본까지는 수출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작년에 또 다른 방법이 개발되어 앞으로는 석 달가량 보관이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항공운송을 하지 않는 이상 프랑스에서 생막걸리를 마시기는 무척 어렵다. 그리고
국내에서 한 병에 천원 남짓 하는 막걸리를 비행기에 태운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것이다.
<출처: 리빙센스>
그렇다면 프랑스의 한인마트에서 살 수 있는 막걸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열처리를 통해 균을 모두 사살(?)한 살균
막걸리다. 살균 막걸리는 최대 1년까지
보관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막걸리의 풍미를 좌우하는 균이 모두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맛은 확실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치즈도 마찬가지이다. 국내에
수입되는 치즈는, 막걸리처럼 유통기한의 문제가 아닌 국내 식품위생법상의 문제이지만,
살균처리하지 않은 생유(生乳)로
만든 것이 아니고 살균유(殺菌乳)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각각이 가진 고유의 풍미가 잘 살아나지 않는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수입된 치즈의 경우 까망베르 치즈와 브리 치즈를 맛으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제대로
된 막걸리와 치즈는 현지에서만 맛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된’ 막걸리를 쉽게 마실 수 있는가? 필자가
말하는 ‘제대로 된’ 막걸리는
쌀과 누룩과 물로만 만든 전통 막걸리를 이야기한다. 사실 우리나라에
시판 중인 대부분의 막걸리는 전통 방식의 누룩이 아닌 일본식의 인공 효모인 ‘입국’을
사용한다. 그리고 대중적인 취향을 위해 설탕보다
200배가량 단맛이 강한 합성첨가물 ‘아스파탐’을
사용하는데 이는 생막걸리의 유통기한을 늘려주는 역할을 한다. 결국,
더 싸게, 더 빠르게, 더
많이 팔아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자본의 논리에 따르는 ‘상품’이
대부분이다.
1970년대 막걸리의 인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공급은 수요를 따르지 못했다. 그래서 발효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공 약품인 카바이드(Carbide)를 첨가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는 ‘막걸리는
숙취가 심한 싸구려 술’이라는 인식을 만들어 내어 오히려 소비자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문제는 역시 돈이었다.
그런데 몇 년 전 텔레비전에서 막걸리를 다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그 프로그램에서는 우리나라에 얼마 남지 않은 제대로 된 전통방식의 양조장 몇 곳을 방문했다.
그 양조장의 장인들은 모두들 고집쟁이였다. 간판도 없는
한 양조장의 장인은 자신의 술을 만드는 데 필요한 최고의 재료를 준비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곡식을 재배하고,
자신의 손으로 누룩을 띄우고, 술을 빚는다.
자기가 원하는 술맛을 내는 데 필요한 재료가 어떤 것인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 아닌가?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두 본인이 직접 손을 대는 것이다. 쌀과
누룩을 시중에서 구입해서 만들면 훨씬 쉽고 빠르고 많이 만들어 낼 수 있지만, 그가
술을 빚는 이유는 그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게끔 우리도 남들처럼 좀 달게 만들자”라고 제안을
해도 대꾸조차 하지 않는다. 그것도 그가 술을 빚는 이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허름한 모습의 양조장에서는 시골의 할머니,
아주머니들이 누룩을 직접 손과 발로 띄워내고 있었다. 그들이
직접 만들어 낸 누룩은 그 양조장의 보물이었다. 예전 밀주
문제가 있던 시절, 그리고 주식인 쌀로 술을 만들어 마시는 것을 금지하던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는 단속이 너무 심해서 누룩을 만들기가 힘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한
번은 단속을 피해 다른 동네로 원정(?)을 가서 누룩을 만들어 봤는데 결국 실패했다고 한다.
같은 사람이 똑같은 재료와 방법으로 만들었지만, 땅과 기후
물 등 기타 조건들이 달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는 말이다. 프랑스 와인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떼루아(Terroir
– 포도밭을 이루는 흙, 물,
기후 등의 총칭)’라는 개념은
우리네에게도 예전부터 중요했던 것이다.
그 집에서 누룩을 만드는 것을 보면 반죽을 한 후 누룩곰팡이가 잘 피도록
-이들은 이 곰팡이를 ‘누룩꽃’이라고
부른다- 숙성실에 한 장 한 장 넣어 둔다. 그런데
누룩 반죽을 올려놓는 대나무로 만든 선반 위에는 긴긴 세월을 지켜온 수많은 곰팡이가 켜켜이 쌓여 있었다.
그 착한 곰팡이들이 누룩 반죽에 꽃을 피우는 주인공들이다. 그
곰팡이들은 단지 하루 이틀 사이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 양조장의
오래된 위대한 유산이다. 최근 막걸리 붐을 타고 주문이 밀려 들어오자 주변에서는 규모 확장
및 자동화를 권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들은 손사래를 친다. 그런
방식으로는 자신들이 원하는 술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이런 고집쟁이 장인들은 부르고뉴의 고집쟁이들을 생각나게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와인들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곳, 그러면서도
그나마 상업화가 덜 진행되고 소규모 수작업이 유지되고 있는 곳 중 하나가 부르고뉴일 것이다. 이름만
들어도 와인 애호가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유서 깊은 생산자들이 한 집 건너 하나씩 있다. 하지만
그런 위대한 도멘 중 제대로 된 간판 하나 없는 곳이 수두룩하다. 잘 모르고
보면 영락없는 시골 농부의 집과 양조장, 창고로 보인다.
하지만 그 말이 맞다. 그들은 몇
대 째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오던 진짜 농부들이다. 그런 유명한
도멘들을 방문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살아있는 전설들이 직접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와, 장화를
신고 손에 흙이 묻은 채로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처음부터 전설이었으랴? 그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면 마을마다,
집집마다 만들어 마시던 자기만의 개성을 가진 와인에 이를 것이다. 그리고
굳센 고집으로 그 개성을 지켜와서 결국 전설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네 조상들은 집집마다 고유한 술이 있었다.
집집마다 훌륭한 양조가가 있었다는 말이고, 그 비법은
입에서 입을 통해 딸들에게, 며느리들에게 전수 되어 이어져 왔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합해져서 문화가 되는 것이다. 그러던 것이
서서히 사라져 어느새 며느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이다. 좋은
술을 빚는 법을 잊어버리니 좋은 술을 빚을 좋은 곡식이 필요 없어졌고, 결국 좋은
곡식을 키울 아름다운 자연마저 잃어버렸다. 우리 조상들의
아름다운 문화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는 양조기술의 복원과 함께 자연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더욱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술의 명맥을 이어가고,
다시 살려내기 위한 노력이 부단히 진행되고 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어떤 쌀을 썼는지, 어떤 누룩과
물을 썼는지, 그리고 누가 빚어냈는지에 따라 각각의 개성이 가득 묻어나는 다양한
우리 술을 다시 맛보길 기대한다. 세계에 자랑할 우리의 문화를 말이다. 프랑스 유로저널 박 우리나라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Category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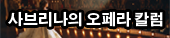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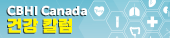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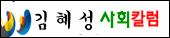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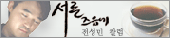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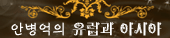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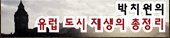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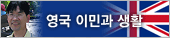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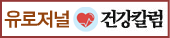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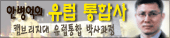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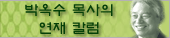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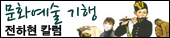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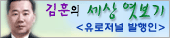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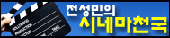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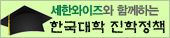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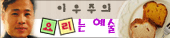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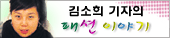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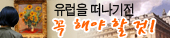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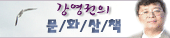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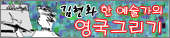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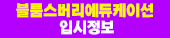


 프랑스 역사 (1968-21세기)
프랑스 역사 (1968-21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