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내가 사랑하는 자는 하나
사람들은 자기를 잊은채 서로에게 무언가를 해준다. 심지어 때로는 목숨까지 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죽음과 삶은 ‘존재’의 두 측면이고, ‘우리’는 한 생명의 두 측면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명을 동일시하고 통합한다. 이것이 우리 삶의 진실이기 때문에, 일단 이 진실에 대한 깨달음에만 이르면 우리는 목숨을 거는 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가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한 것과 중세 신화에서 인류의 마음이 연민(compassion)의 가슴으로 열리는 것, 그리고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에 나오는 인간에 대한 연민(compassion)에 대한 깨달음 또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힘이 나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다.
동양의 불교에서 보살이 자진해서 세상의 슬픔에 참가하겠다는 것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특히, 불교의 수행자가 소를 통해 이런 인간의 본성을 깨닫는 과정을 그린 십우도 (十牛圖) 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십우도
십우도는 처음에 사람이 들에서 뛰어 다니는 소를 찾으러 가는 모습으로 시작된다. 즉 수행자가 사람에게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원성(圓成)인 마음의 소(心牛)를 잃어버린 뒤 그것을 찾으러 나선다.
수행자가 소의 발자국을 발견하여 점차 심의(心牛)의 자취를 보기 시작하게 되고, 소의 울음소리를 듣고 소가 있는 곳에서 소의 모습을 어렴풋이 본다. 그러나 소를 잡았지만 아직 길들여지지 않아 소에 채찍질하는 모습이 나온다. 이제 본성을 찾았지만 아직 번뇌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으므로 더욱 열심히 수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소에 고삐를 물리고 돌아오는 모습으로, 깨달음 뒤에 오는 방심을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길들여진 소를 타고 피리를 불며 돌아오는 모습 속에서는 드디어 망상에서 벗어나 본성의 자리에 들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집에 돌아왔으나 소는 없고 오직 자기 혼자만 남아 있다. 즉 돌아왔으나 쉬지 않고 수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인우구망(人牛俱忘)은 소를 잊고 또 자기를 잊는다는 것을 뜻하기 위해 텅 빈 원 만이 그려져 있다. 정(情)을 잊고 세상의 물(物)을 버려 공(空)에 이르렀다는 것을 비유한다.
티끌 하나없는 수록산청(水綠山靑)의 광경이 그려진 반본환원(返本還源)은 본심은 원래 청정하여 아무 번뇌가 없어 산은 산대로 물은 물대로 보게 되며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참된 지혜를 얻었음을 비유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입전수수(入廛垂手)는 중생제도를 위해 자루를 들고 자비의 손을 내밀어 중생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 모습이다. 마침내 이타행(利他行)의 경지에 들어 중생제도에 나서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것들이 ‘나와 내가 사랑하는 자는 하나’라는 인간의 본질적인 진실을 인지하는 과정을 보여준 것이었다.
되돌림의 예술, 신자연주의(新自然主義)
예술의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목적도 또한 원래의 자리에서 진실을 보기 위한 환원이다. 환원은 관념으로 뒤덮혀 있는 모든 현상들과 사물들 그리고 인간의 삶까지도 제자리로 돌려 놓자는 것이다. 되돌림, 반본환원에 대한 꿈은 일찍이 화엄(華嚴)사상을 구축한 위대한 사상가인 원효 대사가 몸소 보여준 바 있다.
이러한 반본환원은 해체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현대 문학에서는 유감스럽게도 철 지난 포스트모더니즘적인 해체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현상이 세계적인 주류로 자리잡고 있는 실정이다.

원효대사
이와같은 현상을 초래한 것은 첫번째, 철학의 빈곤, 즉 철학의 해체상황이다. 이는 우리의 삶을 들여다 보는 방식이 이제 철학으로서는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철학에 의존해 있던 모든 관념들과 정의가 허물어지게 되었다.
두번째, 이데올로기의 종말로 온 해체현상이다. 양극단의 체재가 무너지게 됨으로써 이데올로기를 형성하고 있던 사상에 대한 회의, 그리고 물리학을 쫒아가지 못하는 서구철학의 한계성의 노출이 해체현상을 심화시켰다.
이러한 위기에서 현상학과 미셸푸코의 독특한 시각과 기호학 등이 세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려 했으나, 이들 조차도 문화를 바탕으로한 상징체계의 각기 다른 형성과정으로 보이는 허점을 노출시키게 된다.
푸코는 삶을 들여다 보는 방법으로 병원의 역사를 택했고, 여기서 감금과 권력과 지배, 그리고 그 관계들을 고찰하려고 시도했다. 훗설과 메를로-퐁티는 도그마가될 수 있는 지적 판단이전의 직관(直觀)을 새로운 해석방법으로 제시하고 현상학적 체계를 구축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훗설의 시각과 방법은 불교의 선(禪)적 과정인 십우도(十牛圖)의 과정과 조금도 다른게 없다. 그리고 현상학의 세계는 선을 통해서 보는 득우(得牛)의 세계만을 엿볼 뿐이지, 십우사상(十牛思想)에서 제시되는 인우구망을 통한 반본환원은 꿈조차 꾸지 못했다. 진실의 존재 여부만을 보여줄 뿐, 진실에 다가가지 못했다.
결국 삶을 철학으로 들여다 볼 수 없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삶을 들여다 볼 수 있을까?
예술이 삶에 대한 해석이자 제기(提起)이다.
되돌림의 예술을 위해서 해체하고 자연적인 질서 속에서 새로움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작가 가나인(1964-)의 ‘신자연주의(新自然主義)’이다. 그는 “예술에서 해체는 사물에의 되돌림이고 이 되돌림은 새로운 질서의 구축이다. 이 새로운 질서는 신 미학(美學)의 태동과 함께할 것이고, 질서는 이제 독자적이고 창조적인 예술철학(藝術哲學)으로 세워질 것이다”라고 말한다.

신자연주의 구조의 인간해석(전기), 가나인, 2014
(다음 편에 계속…)
유로저널칼럼니스트, 아트컨설턴트 최지혜
메일 : choijihye107@gmail.com
블로그 : blog.daum.net/sam107
페이스북 : Art Consultant Jihye Cho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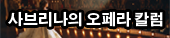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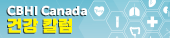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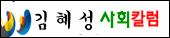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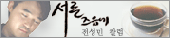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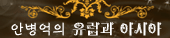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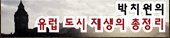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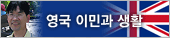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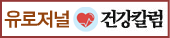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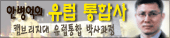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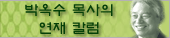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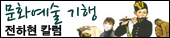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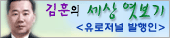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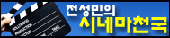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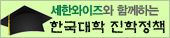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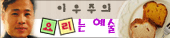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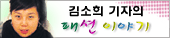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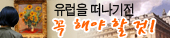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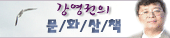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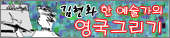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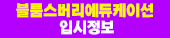



 프랑스 예술산책 : 낭만주의 화가 드라크르와 그리고 19세기 전반...
프랑스 예술산책 : 낭만주의 화가 드라크르와 그리고 19세기 전반...